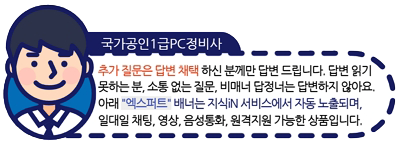우리조상중에 조상시조가 일본사람이 1만명이나 돼나요?500년전에 임진왜란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후 철수도못하고 고립돼서 한국땅에 정착했으면
JW행복경제연구소의 PhD. 이코노마스터가 답변드립니다.
 JW행복경제연구소 : 네이버 블로그
JW행복경제연구소 : 네이버 블로그 부와 여유를 위한 필수 경제 정보. 이코노마스터 쉽게 알려주는 행복한 경제의 길잡이 이야기
blog.naver.com
문의하신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유전적 계통, 문화적 인식이 혼재된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 출신 선조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확인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충선(金忠善) 장군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출신이었으나 전향하여 조선에 충성을 다하고 선조로부터 '김씨' 성과 벼슬을 하사받은 귀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충선 외에도 임진왜란 이후 고립되거나 투항해 조선에 정착한 일본 출신 인물들이 존재하며, 일부는 벼슬을 받고 성씨를 부여받아 양반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가 정확히 1만 명에 달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귀화인은 소수였으며, 노비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고, 신분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김충선 장군의 후손이 오늘날 유명 연예인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나, 공식 족보나 검증된 계보로 연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혼혈' 혹은 '단일민족'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유전학적으로 단일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수천 년 동안 중국·일본·몽골·중앙아시아 등과의 교류와 혼혈은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조상이 몇백 년 전 일본인 한 사람이라면, 현재 그 사람의 DN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1% 미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의 혈통은 유전학적으로 거의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몇 대가 지나면 일본인의 혈이 완전히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유전학적으로 미미하여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귀화일본인 #김충선장군 #임진왜란 #단일민족신화 #조선후기귀화인 #혼혈논쟁 #한국족보 #성씨하사 #유전적비율 #문화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