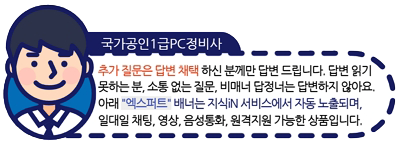토가 너무 싫어요 제목 그대로에요. 비위가 막 약한 편 까진 아니라서 똥오줌 이런거는
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단순히 예민하거나 유별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똥오줌이나 다른 불쾌한 것에는 별 반응이 없지만, '토'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죠. 누군가 토할 것 같다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귀를 막고 싶어질 만큼의 불안이 생긴다면, 이는 분명히 본인에게는 중요한 심리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아들러의 이론을 빌리자면, 이런 감정이나 반응은 단순히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살과 다섯 살 때 두 번 토했던 이후로는 배탈이 나거나 속이 안 좋아도 토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토해서는 안 된다’, ‘토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토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행동을 ‘회피형 생활양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면서도 나름의 안정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억지로 고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에 이 반응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이지만, 앞으로 성인이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토하는 장면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혹은 간호나 보건과 같은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런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이 심해지고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식이 토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인의 감정이 전적으로 ‘토’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감정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본인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는 중요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아들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여 감정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에 대한 단어를 말하는 것부터, 드라마나 영상 속 장면을 짧게라도 시청해보는 식의 노출 연습을 조금씩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작은 훈련들이 점차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토를 견디는 연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자율성과 용기를 기르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러는 인간의 행복은 소속감과 유용감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은 그 과정의 중간일 뿐이고, 이 감정 역시 지나가야 할 하나의 성장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용기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이상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성숙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충분히 이해받아야 할 감정이며, 토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감정을 마주해보세요.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