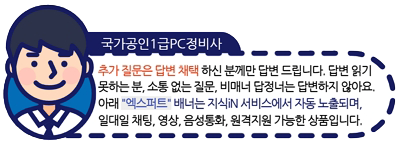국가 입장에서 실업률 통계는 전 세계가 보는거니까 어떻게든 실업율을 줄여야 하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그니까 우리나라는 백수가
좋은 문제의식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실업률 통계는 해외 투자자, 국제 신용평가, 국제 비교지표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여주기용”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업률 지표의 정의 방식이에요.
왜 체감과 통계가 다른가?
실업률의 공식 정의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계청은 “실업자 =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즉,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취업 단념자),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 질 낮은 일자리 종사자는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음.
30대 100명 중 80명 경제활동?
맞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를 보면 30대는 남녀 합쳐 75~80% 정도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자영업 등 모든 노동이 들어갑니다.
→ 그래서 “정규직 80%”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의 입장
실업률을 낮게 유지해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다”라는 신호를 해외에 줄 수 있음.
하지만 동시에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실업률(청년 체감실업, 고용의 질 문제)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짐.
그래서 정부는 보통 공식 실업률 + 보조지표(고용보조지표, 확장실업률) 두 가지를 함께 발표합니다.
✅ 정리하면,
국가는 보여주기 차원에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통계 방식 자체가 “실제로는 백수에 가까운 사람”을 많이 제외하기 때문에 국민 체감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30대 경제활동참가율 80%라는 말은 “정규직 80%”가 아니라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사람 비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