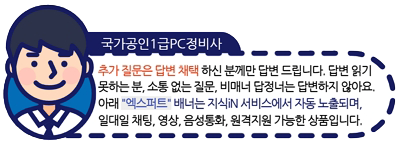조선시대 때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요? 조선시대 때는 휠체어가 없었을텐데, 사고 같은 일로 두 다리가 없어지면
조선시대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역할이 인정된 존재였습니다.조선의 장애인 정책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세조임금은 각종 장애인 대책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합니다.
“잔질(장애인)과 독질(난치병 환자)로서 의지할 곳 없는 자와 맹인들을 위해서는 이미 명통사를 설립했지 않은가. 농아와 건벽(다리등이 없는 지체장애인)들은 한성부가 돌봐줄 ‘도우미(保授)’를 널리 찾고, 동서 활인원이 맡아 후하게 구휼해야 한다. 또한 계절마다 부양한 결과를 계문(보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기마다 농아와 지체장애인들의 구휼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무한돌봄 서비스’입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구휼하기 위한 국가기관인 ‘명통시(明通寺)’를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먹고 살 길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마련해준 것입니다. 명통시 소속 시각장애인들은 독경이나 점복으로 살았고 나라에 가뭄이 들 때는 기우제를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은 정기적으로 쌀과 콩을 하사했으며, 때때로 노비는 물론 건물까지 내려주는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조선시대 장애인에대한 우대정책.
장애인은 조세와 부역, 잡역을 면제받았고, 중증 장애인에게는 생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동서활인원, 제생원 등 구휼기관이 설치되어 위기 장애인을 도왔으며, 부양자(시정) 제도를 통해 활동보조도 지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복가(점술가), 독경가(불경 낭송자), 악공(악기 연주자) 등으로 활동했고, 능력만 있으면 정1품까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벼슬에 오를 수 있었고,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격리 정책이 시작되어, 현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